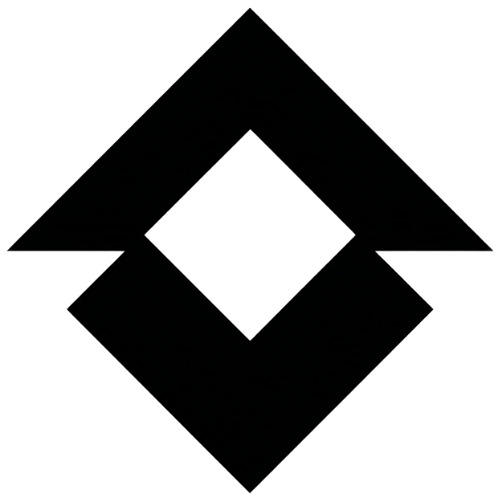언제부터 인가, 같은 꿈을 되풀이해 꾸기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공간.
사람의 온기는커녕 숨결 하나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내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을 가르며 울렸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저 멀리서 스미듯 퍼지는 희미한 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빛은 계단 위에 있었고, 나는 묵묵히, 무작정 그 계단을 올랐다.
그 꿈은 끝도 없이 반복되었다.
똑같은 침묵, 똑같은 풍경, 똑같은 발소리.
그리고 변함없이, 억겁처럼 이어지는 계단을 나는 오르고 또 올랐다.
그날은, 뭐가 달랐던 걸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는 하루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꿈은 아직도 선명하다.
나는 마침내, 그 끝없는 계단의 꼭대기에 닿았다.
기뻤던가.
그래, 어렴풋이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다.
언제나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 계단 위엔 과연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또 무엇이 달랐던 걸까.
아—그날 나는, 빛을 따라 걷지 않았다.
그저 또 반복되는 꿈이려니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디뎠다.
내가 좇고 있던 것이 빛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문 너머의 세상은, 분명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달라 보였다.
나는 그 낯선 풍경을 마주한 채, 문턱에 멈춰 섰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다.
망설이는 사이, 꿈은 끝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나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선 채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들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은, 이름 모를 도시가, 낯선 이들이 눈앞을 지나갔고.
또 어떤 날은, 생명 하나 없는 황량한 황무지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은 거대한 철로 이루어진 생명체들이 도시를 헤집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했다.
또 다른 어느 날, 문 너머의 세상이 문득 궁금해졌다.
그날의 나는, 마침내 관망을 멈추고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 순간이었다.
마치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낯선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고,
눈을 뜬 그 앞엔 붉은 머리를 묶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기운이 스며든 듯한 깊은 검정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만 한 크기의 빛나는 수정 구슬을 손에 쥐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전설 속 마녀 같았다.
처음엔 그녀의 표정에 잠시 놀람이 스쳤으나 그것도 한 순간. 그녀는 입술을 아주 천천히 열었다. 그 순간 기괴한 모양의 치열이 보였다.
“너구나…”
낮게 깔린 목소리였다.
그때, 그녀는 거대한 까마귀로 변신했다.
그 까마귀의 붉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짜 공포를 느꼈다.
마지막으로 내가 공포를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더라.
아, 기억났다.
‘따분했을 때.’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을 때.
모두가 날 피하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그 나날.
그 지독한 정적과 무의미 속에 파묻힌 날들.
나는 그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짜증났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었다. 설명할 수도 없이 온몸을 타고 오르는 낯선 감각.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왜 날 기다리고 있었지?”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낯설었다. 내 목소리인데도, 내가 아닌 것 같았다. 내 물음에 답하려는 듯 까마귀가 입을 열자 그는 다시 인간의 형체를 띈 모습으로 돌아왔다.
“네가 이 세계를 파괴 할 아이니까.”
그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금이 가기 시작한 땅에서 나오는 빛을 보며 나는 중심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공포도, 흥분도, 감각도 사라진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의식을 잃어갔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내 눈앞에 보였던 건 원식 아저씨였다.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그들은 나를
“군주님.”
‘군주’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