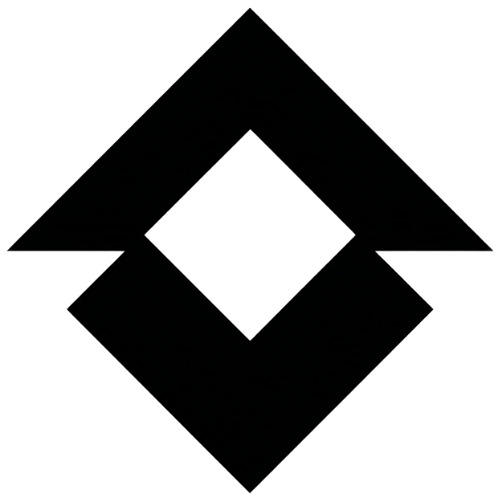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의 2배를 넘어, 압도적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나라.
60대의 자살률마저 증가하는 나라.
합계출산율 0.7명대를 맴도는 나라.
자멸을 선택한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라는 숫자 뒤에는 수많은 개인의 이야기가 있다.
오늘도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용기와 분노로 살아가는 자들의 승리로 기록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건 나의 이야기이다.
이방인이 된 순간
10대 때의 나는 전체 3반밖에 없던 작은 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다.
전교회장까지 했던 나에게 인간관계란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었다.
그런데 중학교 진학을 앞둔 겨울, 갑작스런 이사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학교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방인’이 되었다. 아이들은 이미 견고한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함께 보낸 겨울방학의 추억이 있었고, 나는 그저 새롭고 궁금한 대상일 뿐이었다.
나와 그들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시간의 거리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잘 지냈다. 아니, 잘 지내는 줄 알았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원망, 불쾌함,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 나는 왕따가 되었다.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다. 여자아이들 무리에서 혼자가 된 약자는 금세 남자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그때 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예방주사를 아주 세게, 그리고 아프게 맞았다.
이성 관계든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것처럼.
처음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마음이 공감되었다.
분노가 준 용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쁜 건 걔들인데, 왜 내가?’
나를 죽일 용기가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느꼈던 우울감과 동시에 솟아오른 분노는 내게 또 다른 힘이 되었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고, ‘그런’ 이유로 왕따를 시키거나 시기 질투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낮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짐했다.
인간은 모두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친 존재이니,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항상 겸손해야겠다고.
중학생 1학년이 갖기에는 너무나 성숙하고, 또 너무나 시린 다짐이었다.
자꾸 선을 넘어 오는 친구들
사람에 대한 기대 없이 지내다 보니,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기 어려워했다.
그런 나만의 선을 넘어 벽을 허물고 들어온 친구가 단 한 명 있었다.
내게 친구란 그 친구 한 명뿐이었다. 내가 충성을 다해 마지않는.
21살,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이 나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강제로 함께 숙소 생활을 해야 했던 새로운 친구들은 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왜 저런 걸로 울지?’
‘왜 이런 걸로 서운해하지?’
‘왜 굳이 기다려주지?’
부담으로 느껴졌던 그 모든 표현들이, 사실은 순수하게 나를 좋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나중에 되었다.
나는 확신한다. 누군가의 순수한 호의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평생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자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 우울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것을.
친구들이 내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
‘올 겨울에 이거 개봉한대. 보러가자.’
‘올 여름에 바다 가자.’
‘우리 돈 모아서 해외 여행 다녀와야지.’
또한 자꾸만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던져주었다.
세 번째 위기, 그리고 그 용기
그런 내게 닥친 또 다른 위기는 취업과 현실이었다.
취업 시장에 뛰어든 시기, 코로나가 터졌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점점 초조해졌다. 1년하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때 나는 10대 때 품었던 자살에 대한 나의 관점을 다시 떠올렸다.
그 용기가 있다면 당장 남들이 보기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해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후로 내 인생은 생각보다 평탄하게 흘러갔다.
‘This too shall pass away.’ 10년째 내 핸드폰 배경화면을 지키고 있는 글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그 말을 참 좋아한다.
우울도, 분노도, 행복도, 슬픔도, 즐거움도, 젊음도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갈 테니까.
나는 죽을 용기를 살 용기로 바꾸는 데 분노를 사용했다.
그것이 내가 찾은 생존의 방식이었다.
‘이한나’는 이런 나의 경험과 성격이 가장 많이 투영된 인물이다.
이 우주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한나에게,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